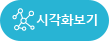| 항목 ID | GC60001679 |
|---|---|
| 한자 | 光州邑城北門拱北門 |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 유형 | 유적/건물 |
| 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 집필자 | 이수경 |
| 원소재지 | 광주읍성 북문 공북문 - 광주광역시 동구 |
|---|---|
| 성격 | 성문 |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류와 문인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광주읍성 북쪽은 공북문(拱北門)이라는 이름이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다. 광주읍성 북문의 의미는 '북쪽을 공손히 받든다.'는 뜻인데 북쪽은 임금을 상징한다.
광주읍성 북문 공북문은 충장로3가 세칭 '충파[충장치안센터]' 앞에 있었다. 북문 밖에 있던 공북루(拱北樓)와 유림숲을 지나 비아장을 거쳐 장성을 통과하여 도성으로 이어졌다.
광주읍성 북문을 일러 공북문이라고 한 데에는 이 길을 쭉 타고 나가면 서울에 갈 수 있다는 의미도 있었다. 공북문을 광주의 기점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오늘날 광주의 도로원표(道路元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도나 지방도를 타고 오다가 '광주 30㎞'란 표시를 본다면 그 '광주'란 광주광역시청도, 옛 전라남도청 자리도 아닌, 바로 도로원표가 서 있는 지점을 가리킨다. 북문과 도로원표는 같은 축선에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에 공북문 바깥인 지금의 충장로4가는 '시리(市里)'라고 불렀다. 시리란 '장터마을'이란 뜻이다. 광주에서 맨 처음 장이 열렸던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1896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광주에 머문 지도군수 오횡묵이 남긴 기록에는 "큰 장이 공북루 앞에서 열렸다,"고 쓰여져 있다. 현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중앙로에서 충장로4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한다. 큰 장터는 북문 밖 시리 혹은 광주천변에서 열렸던 것이 훗날 광주천변으로 옮겨 큰 장과 작은 장이 되었다.
광주읍성 북문 공북문의 모습은 다른 성문과 달리 철거 전에 촬영한 몇 장의 사진이 남아 있어 그 형태나 구조를 잘 알 수 있다. 북문은 2층 문루 형태이고, 정면 3칸 측면 3칸이었다. 가운데 칸에는 문을 달아매었고 그 좌우 칸에는 널판을 세워 막았다. 2층은 다락 형태의 마루를 깔고 지붕은 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었다.
광주읍성 북문 공북문 터에 가면 예전 공북문 터였음을 알리는 작은 표지석이 있다. 그리고 사거리 근처 인도에 큼직한 석재로 도로원표를 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북문 공북문의 안과 밖의 변화상을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 철거 전의 북문 공북문과 공북루 사진은 조선시대 광주목 관아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증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광주읍성』(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997)
- 『1896년 광주 여행기』(광주역사민속박물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