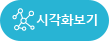| 항목 ID | GC05702085 |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설화 |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 집필자 | 박순호 |
| 채록 시기/일시 | 1982년 6월 - 「임자가 따로 있는 명당」 채록 |
|---|---|
| 채록지 | 「임자가 따로 있는 명당」 채록지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
| 성격 | 민담 |
| 주요 등장 인물 | 도선 |
| 모티프 유형 | 민담 |
| 제보자 | 이창성[남, 70세]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옛 군산역에서 채록된 민담.
[채록/수집 상황]
1989년 6월 당시 70세의 이창성에게서 채록된 「임자가 따로 있는 명당」 이야기는 2000년에 간행된 『군산 시사』에 기록되어 있다. 채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조사자가 명당 이야기 하나를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상스런 이야기 말고는 더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그것도 좋다고 하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제보자 이창성이 명당 이야기 하나를 더 했다.
[내용]
그 박상의 도선이가 말이요. 응, 지리 박사거든요. 우리나라, 그 양반이 동지 섣달이 쉽게 말하믄 저런 월명산 같은디 저 산 이리, 떡 지나가는디 말이지. 웬 한 사람이 거서 땅을 파고 있어. 쳐다본게나 지게다가 뭘 짊어지고, 그래 인저 본게, 큰 대지여. 큰 명당인디 말이여. 올라가서 보네나 참, 그누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말이지 총각인디 말여. 넘의 집을 살어. 넘의 집 머슴 사는 사람인디 말여. 자그 어머니하고 둘이 모친 둘이 살다가서는 자그 어머니 죽은거 어떡하는겨. 자그 혼자 인자 손그적대기다 뚤뚤 말아서 지게나 짊어지고서 따땃한다만 찾아가서 눈은 있응게 한간디 한 산모퉁이 돌아간게나 눈이 다 녹아버렸어. 녹아버려. 칡순이 하나 이렇게 올라 오드래야.
“여그다 써야겄다.”
허고 판게 참 그 박상의 도선이가 지나가다 보넷나 큰 대지여. 쫓아 올라가지고서는 못 쓰게
“여그다 말이다. 임자가 다 있는디다.”
그때로 말헐 것 같으믄 어느 영이라고 참 그런 어른이 지나가다 그럭한게 뭐 쓸 수가 있가디? 게 지게를 짊어지고서 한 모퉁이를 또 돌아간게는 거그는 눈이 녹았는디 칡순이 두 개가 올라왔드래야. 거그르 또 파. 아, 거그는 더 좋아. 더 큰 대지여 그냥. 그걸 또 못 쓰게 또 말렸어. 그래 짊어지고서는 또 한 쪽으로 돌아간게나 눈이 그냥 거그도 녹았드래여. 근디 칡순이 시 개가 올라왔드래여. 거그는 칡순이 시 개가 올라왔는디 거다 놓고 또 파. 판게나 박상의 도선이 그, 저, 지리 박사가 쳐다본게나 아, 암만 해도 이게 니 땅인가 보다 묘 쓰닝게는 구경이나 허자고 어떻게 쓰는가 본다고 묘자리나 이렇게 파고서 말여. 신체를 늘라고 헌게 말이여. 좀 짤롭게 팠드래여. 짤롭게 파가지고서는 게 이 근방은 산마루 쪽으서도 저리 그 전에는 말요. 그 전에는 묘자릴 파믄 말이요. 신체 거 늫다가 다시 꺼낸 법이 없어요. 이 그런게 언지덕지 넉넉하게 파거든, 짤롭게 팠거든. 네모지게 빤듯하게 파 놓고서 신체를 늘라곤게 짧어. 그랴지고 그 지리 박사 그 양반은 말이지 그 안대를 어떻게 놀려나 보느라고 본게 이렇게 쉽게 말허머는 안대를 요렇게 둘러서 파얄 것인디 쪼금 삐둘어졌어. 이, 어, 쪼금 삐뜰어졌거든. 내떤져 뒀드래야. 삐뜰어지게 파거나 말거나 내떤져 뒀는디 파고서 신체를 놀라고 본게나 짧어. 짧은게 이렇게 귀챙이 너, 이렇게 틀은게 맞어. 본게 고대로 똑바로 놓거든. 그 물팍을 딱 치면서, 응 여가 내 자리라 하고서는 그냥 거그다 묘를 쓰고서, 야는 가가지고 부자로 잘 살게 됐는디 게서 그 박상의 도선이가 그 묘자리 먼저 그 못 파게 한다 말여. 거그를 가가 본게나 말이여. 신체 아니라 어른일라 애장도 못쓰게 생겼드래여. 그 자리는 에, 게 그 사람 거시기를 일러주는 것 아뇨. 그게 일러준 거라. 그게 잉. 그 사람 잘 살게 하는 그 사람 복이 있기 땜이, 그래 가지고 그 총각이 말여. 그 머심이 뫼면[모면]하고 잘 살더랍니다. 그 사람 복이 있은게 그렇게 사는 것이요.
- 『군산 시사』(군산 시사 편찬 위원회, 2000)